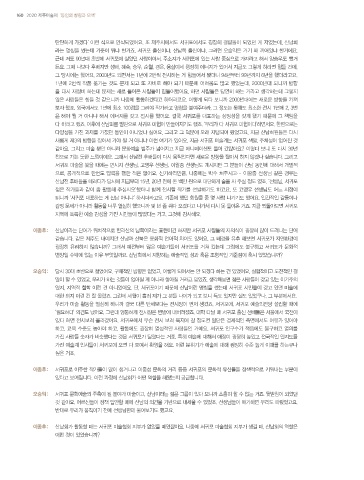Page 157 - 제주미술제 2020
P. 157
160 2020 제주미술제 ‘동인의 창립과 모색’
탄탄하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었어요. 또 제주시에서도 서귀포에서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던 게 저였는데, 산남회
라는 명칭을 썼는데 기준이 뭐냐 한거죠. 서귀포 출신이냐, 산남쪽 출신이냐, 그러면 오승익은 거기 왜 끼어있냐 한거에요.
근데 저도 90년대 초반에 서귀포에 살았던 사람이어서, 주소지가 서귀포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가자라고 해서 양승우도 했거
든요. 그때 나보다 후배지만 성배, 혜숙, 승우, 순철, 경은, 용삼이네 굉장히 에너지가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라면 힘들 건데,
그 당시에는 했어요. 2000년도 되면서는 1년에 2번씩 전시하는 게 힘들어서 봤더니 94년부터 99년까지 6년을 했더라고요.
1년에 2번씩 작품 옮기는 것도 문제 되고 또 자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했었는데, 2000년대 되니까 방향
을 다시 재정비 하는데 문제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 것 같으니까 나중에 활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0년대에는 새로운 방향을 가져
보자 했죠. 외국에서도 1년에 최소 100점을 그려야 작가라고 명칭을 붙여주더라, 그 정도는 못해도 최소한 전시 1년에 2, 3번
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에너지를 갖고 전시를 했어요. 결국 서귀포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하려고 했죠. 이후에 산남회를 발판으로 서귀포 미협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우리가 다 서귀포 미협이다’하면서요.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가진 과제를 가졌던 동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오래 지탱되어 왔었고요. 지금 산남회원들은 다시
새롭게 제3의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서귀포 미술계는 서귀포 색깔, 주체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범주가 넓어지고 지금 애니메이션도 들어 갔잖아요? 이렇다 보니 또 다시 30년
전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산남전 후배들이 다시 움직인다면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미술을 봤을 때에는 변시지 선생님, 고영우 선생님, 이왈종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분들이 산남 동인에 대해서 개별적
으로, 공개적으로 한번도 압력을 행한 적은 없어요. 신기하리만큼. 나중에는 박수 쳐주시고… 이왈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산남전 후배들을 데려다가 당시에 지금부터 15년, 20년 전에 돈 백만 원으로 대단하게 술을 사 주실 정도 였죠. ‘선생님, 서귀포
젊은 작가들과 같이 좀 활동해 주십시오’했더니 함께 전시할 작가를 선발하기도 하고요. 또 고영우 선생님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서귀포 대표하는 게 산남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회원들 중 몇 사람 나가기도 했어요. 인간적인 갈등이나
감정 문제가 아니라 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몇 년 좀 쉬다 오겠다고 나가서 다시 못 들어온 거죠. 지금 되돌아보면 서귀포
지역에 독특한 예술 감성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다는 거고, 그것에 감사해요.
이종후: 산남이라는 단어가 위치적으로 한라산의 남쪽이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서귀포 사람들의 자의식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단어
같습니다. 같은 제주도 내이지만 산남과 산북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도 있어요. 그 배경을 유추 해보면 서귀포가 자연환경이
굉장히 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서귀포를 거쳐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가 문화적
변방일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산남회에서 지향하는 예술적인 성과 혹은 조형적인 기준점이 혹시 있었습니까?
오승익: 당시 30대 초반으로 젊었어요. 구체적인 방향은 없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건 있었어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걸
많이 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없어질 게 아니라 쌓아질 거라고 믿었죠. 생각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기주의
였지, 지역적 철학 이런 건 아니었어요. 단, 서귀포이기 때문에 산남이란 명칭을 썼는데 서귀포 시민들이 갖고 있던 미술에
대한 의지 이런 건 잘 몰랐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그 분들 나이가 되고 보니 득도 있지만 실도 있었구나, 그 부분에서요.
우리가 미술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결국 다른 단체보다는 전시장이 먼저 생겼죠, 서귀포에.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립할 때에
‘필요하다’ 의견도 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전시장은 변방에 내버려졌죠. 대학 다닐 때 서귀포 출신 선배들은 서울에서 국전이
있다 하면 전시보러 올라갔어요. 서귀포에서 무슨 전시 보러 육지에 갈 정도면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야 하고, 활동에도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서귀포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진 사람들 숫자가 비슷했다는 것은 서귀포가 달랐다는 거죠. 특히 예술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높았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예술계 인사들이 서귀포에 오면 다 모여서 환영을 해요. 이런 분위기가 예술에 대해 굉장히 수준 높게 이해를 하는구나
싶은 거죠.
이종후: 서귀포로 이주한 작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중섭 문화의 거리 등등 서귀포의 문화적 유산들을 정책적으로 키워내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에 산남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오승익: 서귀포 문화예술의 주축이 된 분야가 미술이고, 산남이라는 젊은 그룹이 있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뒷받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정책 입안할 때에 산남의 의견을 기반으로 내세울 수 있었죠.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우리도 따랐었고요.
반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했고요.
이종후: 산남회가 활동할 때는 서귀포 미술협회 지부가 없었을 때였잖아요. 나중에 서귀포 미술협회 지부가 생길 때, 산남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